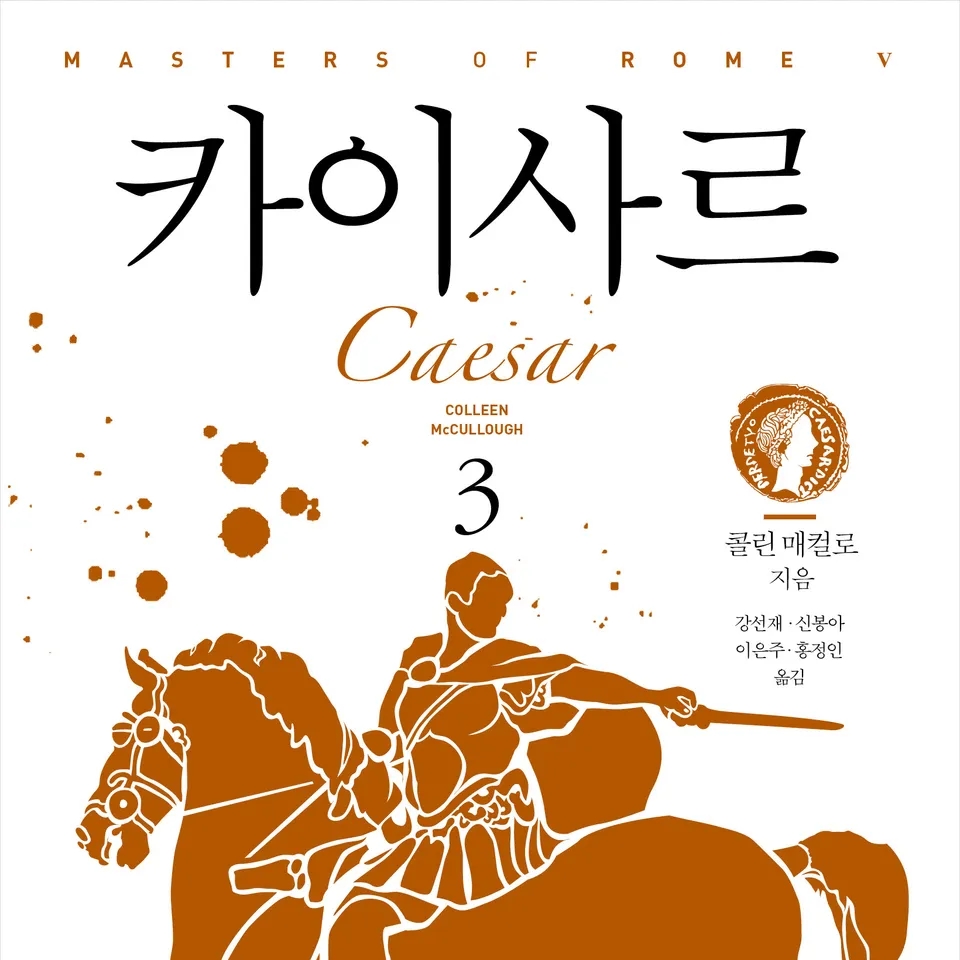카이사르 3
마스터스 오브 로마 5부
Caesar
Book 5 of 7: Masters of Rome
Colleen McCullough | 1998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며 내전이 시작됩니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적대하고 맞서지만, 카이사르가 주로 구사하는 기동력에 밀려 동방으로 철수합니다. 이렇게 이탈리와 로마를 접수한 카이사르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혼란을 안정시키고 서방도 제압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폼페이우스와의 격돌은 이 과정에서 백미입니다.
Alea iacta est
그는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소리내어 웃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메난드로스의 시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사위를 높이 던져라!”
그는 그리스어로 크게 외치더니 발부리의 옆구리를 부드럽게 찼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 이탈리아 속으로, 반란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루비콘 강 ― 기원전 49년 1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수에토니우스판 해석인 ‘주사위는 던져졌다!’일 겁니다. 이 표현을 저자는 플루타르코스판 해석에 본인 해석을 더해 문학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역사로만 접한 경우에 익히 듣는 표현들을 저자는 다르게 서술하는 경우가 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찾으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저는 수에토니우스판 표현이 더 와닿긴 합니다. 더 짧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로마에 갔을 때 테베레 강을 처음 보고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흐르는 강보다도 좁은 강폭에 무척이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역사에 전세계 모두가 아는 강 이름 루비콘은 로마 테베레 강보다도 훨씬 좁다고 하니 바람빠진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파리 세느강도 실망하긴 마찬가지 였던 기억이 스칩니다. 한강이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큰 강에 속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파르살루스 전투
아, 폼페이우스, 당신은 바보다! 바보!
라비에누스가 이 전투를 이끌게 하다니.
당신은 어리석고 허술한 세 가지에 모든 것을 걸었어.
첫째, 당신의 기병대가 내 우익을 측면 포위하여
뒤쪽에서 나를 공격할 물리력이 있다는 것.
둘째, 당신의 보병대가 내 군인들을 놀라게 할
물리력이 있다는 것.
셋째, 내 병사들이 당신이 있는 곳까지 뛰어가게 해서
지치게 만들리라는 것.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반대쪽,
적군의 궁수와 투석병 들 뒤에서 덩치 큰 흰색 공마에 앉아 있는
폼페이우스를 바라보았다.
안됐군, 폼페이우스.
당신은 이 싸움에서 못 이겨, 아주 크게 질 거야.
서방, 이탈리아와 로마, 동방 ― 기원전 49년 4월 6일부터 기원전 48년 9월 29일까지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빼앗기게 된 계기가 6.25 때입니다. 착각이 대단했던 이승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군이라는 능력이 제대로 된 전투 경험이 없어 벌어진 참극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참전했을 때는 미군도 놀랄 정도로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북한은 남한을 두려워합니다.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아무리 백전노장이라 했을지라도 당시 가장 최근까지 실전 경험을 쌓은 것은 카이사르였고, 부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갈리아 정복기를 읽었다고 한다면 카이사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능력이라는 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질이라 것도 해당되지만, 남이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분간하는 눈도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마지막
나는 로마인 귀족이다.
저들이 죽어가는 나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신체 부위를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로마인 귀족답게 죽어야 한다!
폼페이우스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애를 썼다.
한 손으로 토가를 잡아채 허벅지까지 내리고
다른 손으로는 주름 잡힌 부분을 잡아 얼굴을 가렸다.
검 끝이 노련하고도 힘차게 그의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서방, 이탈리아와 로마, 동방 ― 기원전 49년 4월 6일부터 기원전 48년 9월 29일까지
로마 풍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폼페이우스의 마지막입니다. 영웅은 한 시대에 같이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폼페이우스에게 카이사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이건 소설이니 여기에 표현된 이 인물을 놓고 생각의 나래를 펼쳐보긴 했습니다. 그래도 매력적이었을까? 로마에 대한 큰 구상을 가졌을까? 이에 대해서는 바로 부정하게 됩니다. 자고로 리더라는 자리는 남들보다 앞서봐야할 안목이 있어야 하고, 특히 대국에 속한 리더라고 한다면 100년을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미리 그렸던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結
5편 ‘카이사르’가 끝났습니다. 삼두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갈리아 반목을 제압하고, 로마를 향한 쿠데타까지 그려진 이 여정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 어떤 시대를 관통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주변인물과 상대인물들을 통해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자질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벌어지는 참극은 생각만해도 아찔해집니다. 누구도 겪으리라 예상하지 못한 쿠데타를 겪어보니 더 몸서리가 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