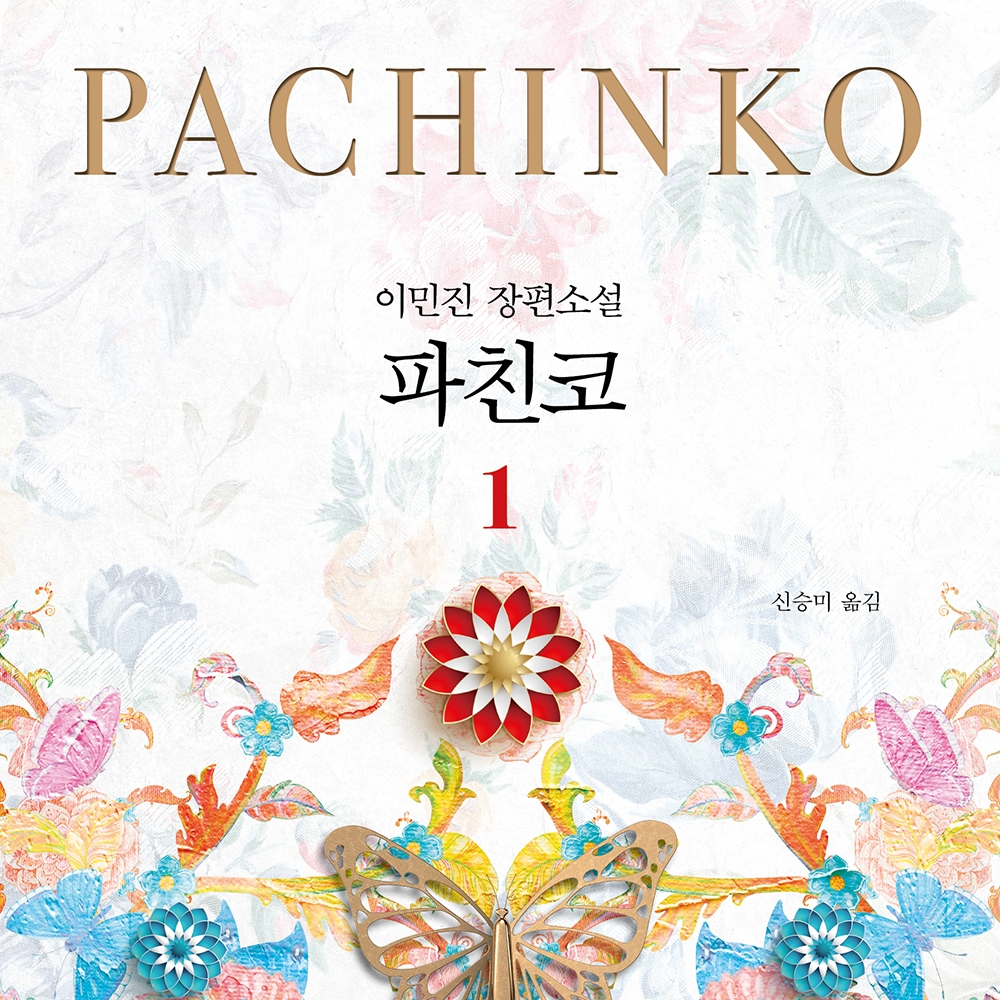파친코
Pachinko
이민진 | 2017
디아스포라 Diaspora. 저자 이민진님이 쓴 전작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Apple TV 에서 시즌 1을 보고 너무 재밌게 봐서 책을 찾아 읽게 된 경우입니다. 이 전 포스팅이 ‘이주’라는 주제를 가진 역사책이라면, 이 책은 같은 주제로 인간을 내밀하게 바라보는 소설입니다. 특히 우리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삭이 준 기회와 선자의 이주
이삭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님에게 좋은 혼처는 아닐 겁니다.
제가 곧 다시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사랑할 겁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이기도 해요.”
이삭은 아이를 키울 만큼 오래 살 생각을 하니 행복했다.
1부 고향 1910-1933
드라마도 디테일을 참 잘 잡아냈지만, 아무래도 글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삭이 결혼하려는 이유는 선이 굵은 배우가 연기한 탓인지 전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시작은 부산 영도 어촌 마을입니다. 주인공인 선자 부모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선자가 유부남 한수 아이를 임신하고, 마침 하숙하던 목사 이삭과 결혼하여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즉, 이주가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듯 그 과정에서 받는 억압들이 드러나지 않게 표현한 작가는 절제가 주는 강렬함을 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 정체성과 독립성
한수는 요셉의 분노를 눈치챘다.
“선자는 내가 떠나기를 바랐지.
그래서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일단 떠났어.
돌아왔더니 선자가 없더군.
이미 혼인했다더라고. 당신 동생과.”
요셉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삭이 선자에 대해 말해준 것이 거의 없었다.
2부 모국 1939-1962
한수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자 일행을 위험에서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도 선자 일행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이 소설이 마냥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만을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이 정주민과 부딪히며 삶을 감내하는 과정을 그린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거라 먹먹해집니다. 그럼에도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 않는 것은 그 시련을 버티는 과정이 있기 때문일겁니다. 나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그 삶을 생각하니 무거운 걸겁니다.
세대를 넘어가는 이방인
모자수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자수는 동네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노아가 자랑스러웠다.
모두가 노아를 존경했다.
2부 모국 1939-1962
이야기는 점점 그 아래 세대로 내려갑니다. 너무도 다른 두 형제 노아와 모자수가 중심입니다. 똑똑하고 내성적인 노아와 활달하고 가족을 위해 강한 기질을 가진 모자수. 이들이 각각 차별이 강한 일본내 조선 사회 속에서 겪는 정체성 혼란과 방항으로 당시 시대상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유리천장
“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솔로몬이 말했다.
“피비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구나.”
솔로몬이 아버지의 책상에서 장부를 집어 들었다.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아빠.”
3부 파친코 1962-1989
책을 읽던 중 가장 씁쓸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선처럼 사람 사는 곳은 유리천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일어서려고 노력하지만,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이 참 맵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주라는게 쉬운 결정은 아닐겁니다. 자의든 타의든.
結
‘파친코’가 제일교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사실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일본 사행성 사업이라는 것 외엔 일제강점기 이후 아는 내용이 없었다는 건 이미 우리도 과거를 잊고 있는거나 매한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은 토착왜구를 위정자로 버젓이 뽑는 우를 범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한 민족, 바로 우리 민족이 겪은 디아스포라 역사가 개인이라는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그 안에 차별, 가난, 이방인이라는 무거운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의연함은 책 첫머리로 함축됩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