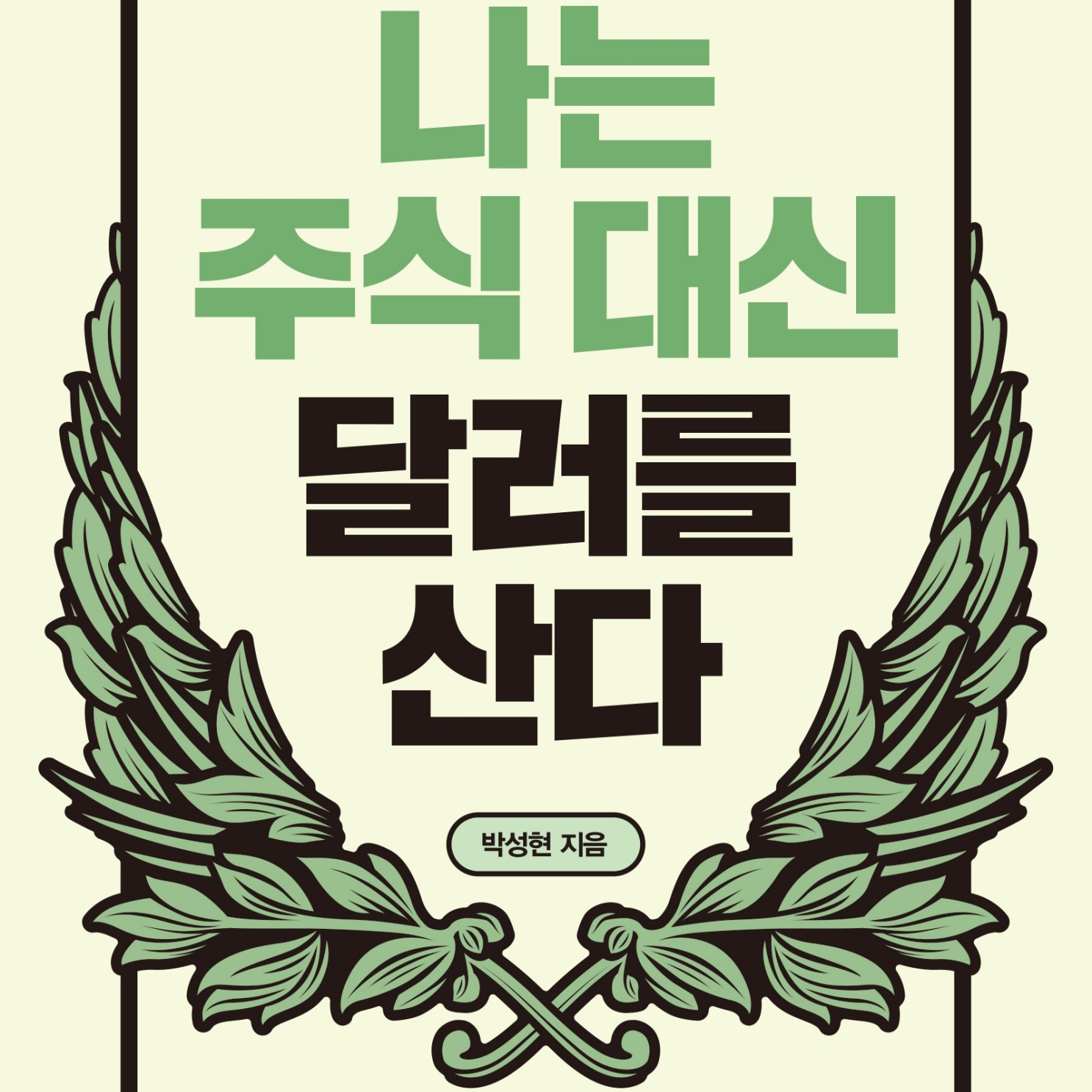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성공률 100% 투자자의 기발한 파이프라인
저자 박성현님이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 먼저 쓴 책입니다. 발행연도 기준으로 4년 정도 앞서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본 이유는 달러 투자에 대해 박성현님이 만든 세븐 스플릿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서 입니다. 특히 매도에 대한 부분을 찾지 못해 혹시 이전에 출간한 책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처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수익률
나는 매수할 때부터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는다.
목표 수익률을 정하기 힘든 경우라면, 투자 기간이라도 미리 정해놓는다.
그렇게 한다고 매도한 뒤 가격이 더 오르는 일을 막을 순 없다.
6장 실전 달러 투자
04 달러를 팔아야 할 때
단서(?!)를 찾았습니다. 매도 기준, 즉 익절 기준은 목표 수익률을 따릅니다. 그 수익률이 되면 매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꼭 따라야 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고 기준에 도달하면 뒀다가 나중에 팔아도 됩니다. 다만 그 전에는 팔지 안되 기준 시점으로 익절하던지,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수익이 나면 파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팔았을 때 이후 더 이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변동폭이 그리 큰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그런 배경으로 다시 매수해서 매도할 기회는 얼마든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왜 최근에 쓴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에는 누락시켰는지 의문입니다.
달러의 변동성
주식 투자의 경우 하루 5% 정도의 가격 변동이 일반적이지만,
달러 투자의 경우 그보다 낮은 0.5%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달러 투자의 투자 단위는
주식 투자의 그것보다 약 5~10배 정도 크게 설정한다.
7장 세븐 스플릿 달러 투자 시스템
03 최초 매수와 추가 매수
7장에는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담긴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저자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그 성향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식과 달러를 비교하여 그 투자 단위는 변동폭에 따른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변동폭과 투자 단위는 반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수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방편일겁니다.
세슨 스플릿 매도 기준
세븐 스플릿은 장기 투자뿐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하는 구조이므로
주식 투자 시엔 최소 3%, 달러 투자 시엔 최소 0.3% 이상의 수익률로
수익을 실현해야 유의미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7장 세븐 스플릿 달러 투자 시스템
03 최초 매수와 추가 매수
매도 기준에 대한 수치가 나온 부분입니다. 0.3%. 1,000원 기준으로 3원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이니 수수료를 포함하면 안전하게 5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요한 기준을 책 전체에 통틀어 정말 몇 줄 안됩니다. 매수와 추매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지만, 최소한 매도에 대한 방향을 좀 더 설명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븐 스플릿 매수 기준
세븐 스플릿 달러 투자 시스템의 추가 매수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 투자 단위 : 최소 3원이 상승해도 유의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 금액으로 설정
- 추가 매수 갭 : 최소 3원의 갭으로 추가 매수하며, 가격대에 따라 추가 매수 갭을 좁히거나 투자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설정
7장 세븐 스플릿 달러 투자 시스템
03 최초 매수와 추가 매수
추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수치가 좀 더 나와 있어 참고할만 합니다. 물론 앞 부분에는 달러 투자에 대한 본질이 있어 좀 서두가 긴 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자신만의 세븐 스플릿을 만들기 위한 참조 수치들을 6장부터 7장까지 확인하면 제법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최근 저작을 한 번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크게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結
박성현님이 만든 이 방법은 나름 흥미로운 구석이 많습니다. 저도 백테스트를 하기 위해 Open API 를 뒤져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코드를 좀 만지고 있습니다. 다만, 책 내용이 세부 목차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함축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많아 저처럼 한꺼풀 벗겨야 내용이 이해되는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쉽습니다.